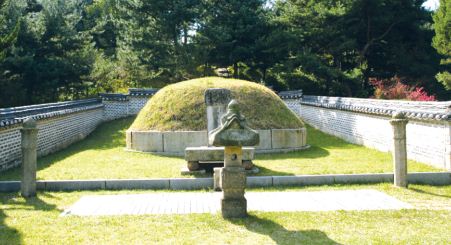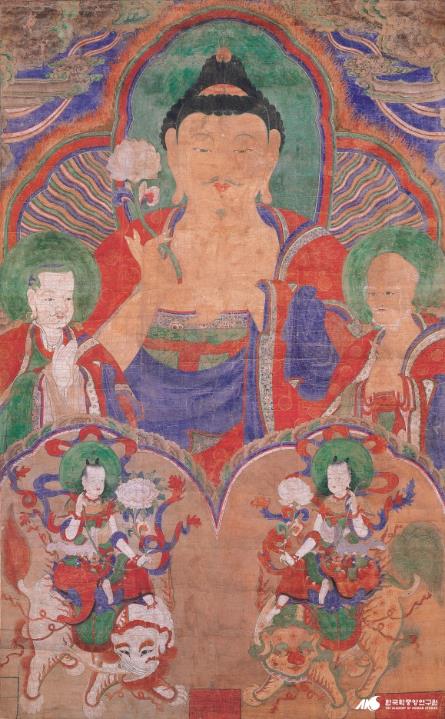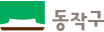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- 종합민원
- 행정정보
- 참여소통
-
분야별정보
분야별정보

- 우리동작
- 이용안내
- 나의 동작
분야별정보
본문 시작
Total : 38 개 [ 2/4 Pages ]
- 자료관리담당
-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/ 02-820-9413
- 최종업데이트
- 2026년 01월 07일
-
부서별 홈페이지
- 감사담당관
- 건설행정과
- 건축과
- 경제정책과
- 공원녹지과
- 교통행정과
- 기획조정과
- 도로관리과
- 도시계획과
- 도시안전과
- 도시정비1과
- 도시정비2과
- 문화정책과
- 민원여권과
- 복지정책과
- 복지사업과
- 부동산정보과
- 신청사이전추진단
- 사회보장과
- 아동여성과
- 어르신정책과
- 예산회계과
- 영유아보육과
- 운영지원과
- 일자리정책과
- 장애인복지과
- 재산관리과
- 재산세과
- 주차관리과
- 주택지원과
- 지방소득세과
- 징수과
- 청년청소년과
- 청소행정과
- 체육정책과
- 치수과
- 핵심정책추진단
- 행정자치과
- 홍보담당관
- 환경과
- 기획재정국
- 도시교통국
- 미래교육국
- 복지국
- 생활경제국
- 안전환경국
- 행정자치국
- ===== 건강관리청 =====
- 보건행정과
- 감염병관리과
- 건강증진과
- 보건의약과
- 보건지소
- 동주민센터
-
패밀리·유관 / 관내 주요기관
- 디지털동작문화대전
- 동작구의회
- 동작구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
-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
-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
- 주정차위반조회
- 전자도서관
- 통합도서관
- 동작문화재단
- ====================
- 동작구시설관리공단
- 동작구치매안심센터
- 동작구 가족센터
-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
- 대방청소년센터
-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
- 동작구일자리플러스센터
-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
- 동작문화원
- 동작구자원봉사센터
- 동작50플러스센터
- 동작휴양소
- 서울여성플라자
- ====================
- 국립현충원
- 기상청
- 동작경찰서
- 동작관악교육지원청
- 동작도서관
- 동작세무서
- 동작소방서
- 보라매병원
- 숭실대학교
- 중앙대학교
- 중앙대학교병원
- 총신대학교
- 서울시 / 자치구








 검색
검색